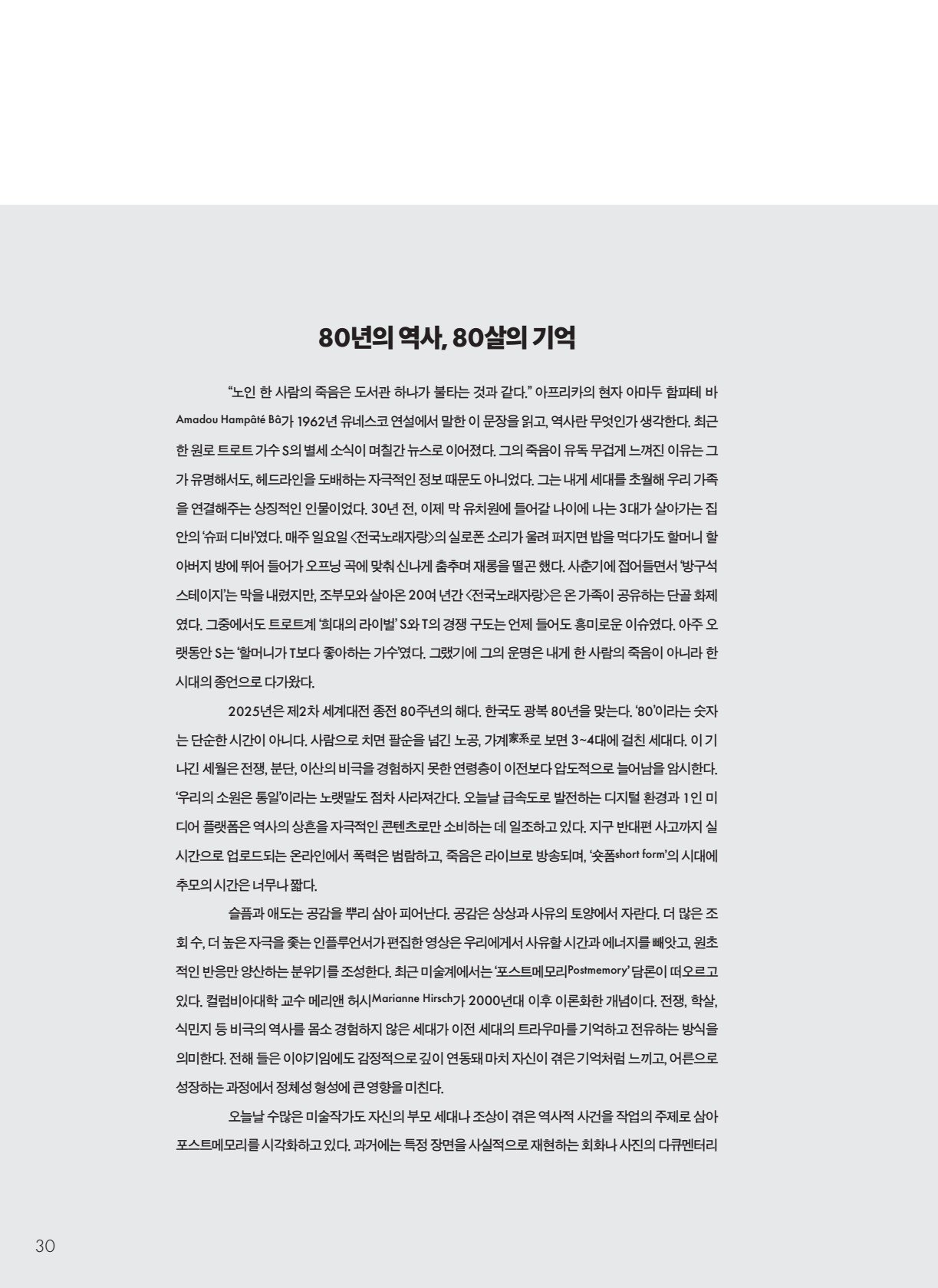
32페이지 내용 : 80년의 역사,80살의 기억 “노인 한 사람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아프리카의 현자 아마두 함파테 바 Amadou Hampâté Bâ가 1962년 유네스코 연설에서 말한 이 문장을 읽고, 역사란 무엇인가 생각한다. 최근 한 원로 트로트 가수 S의 별세 소식이 며칠간 뉴스로 이어졌다. 그의 죽음이 유독 무겁게 느껴진 이유는 그 가 유명해서도, 헤드라인을 도배하는 자극적인 정보 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내게 세대를 초월해 우리 가족 을 연결해주는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30년 전,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에 나는 3대가 살아가는 집 안의 ‘슈퍼 디바’였다. 매주 일요일 전국노래자랑 의 실로폰 소리가 울려 퍼지면 밥을 먹다가도 할머니 할 아버지 방에 뛰어 들어가 오프닝 곡에 맞춰 신나게 춤추며 재롱을 떨곤 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방구석 스테이지’는 막을 내렸지만, 조부모와 살아온 20여 년간 전국노래자랑 은 온 가족이 공유하는 단골 화제 였다. 그중에서도 트로트계 ‘희대의 라이벌’ S와 T의 경쟁 구도는 언제 들어도 흥미로운 이슈였다. 아주 오 랫동안 S는 ‘할머니가 T보다 좋아하는 가수’였다. 그랬기에 그의 운명은 내게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언으로 다가왔다. 202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의 해다. 한국도 광복 80년을 맞는다. ‘80’이라는 숫자 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사람으로 치면 팔순을 넘긴 노공, 가계家系로 보면 34대에 걸친 세대다. 이 기 나긴 세월은 전쟁, 분단, 이산의 비극을 경험하지 못한 연령층이 이전보다 압도적으로 늘어남을 암시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랫말도 점차 사라져간다.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과 1인 미 디어 플랫폼은 역사의 상흔을 자극적인 콘텐츠로만 소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지구 반대편 사고까지 실 시간으로 업로드되는 온라인에서 폭력은 범람하고, 죽음은 라이브로 방송되며, ‘숏폼short form’의 시대에 추모의 시간은 너무나 짧다. 슬픔과 애도는 공감을 뿌리 삼아 피어난다. 공감은 상상과 사유의 토양에서 자란다. 더 많은 조 회 수, 더 높은 자극을 좇는 인플루언서가 편집한 영상은 우리에게서 사유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원초 적인 반응만 양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최근 미술계에서는 ‘포스트메모리Postmemory’ 담론이 떠오르고 있다. 컬럼비아대학 교수 메리앤 허시Marianne Hirsch가 2000년대 이후 이론화한 개념이다. 전쟁, 학살, 식민지 등 비극의 역사를 몸소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이전 세대의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전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전해 들은 이야기임에도 감정적으로 깊이 연동돼 마치 자신이 겪은 기억처럼 느끼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수많은 미술작가도 자신의 부모 세대나 조상이 겪은 역사적 사건을 작업의 주제로 삼아 포스트메모리를 시각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장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회화나 사진의 다큐멘터리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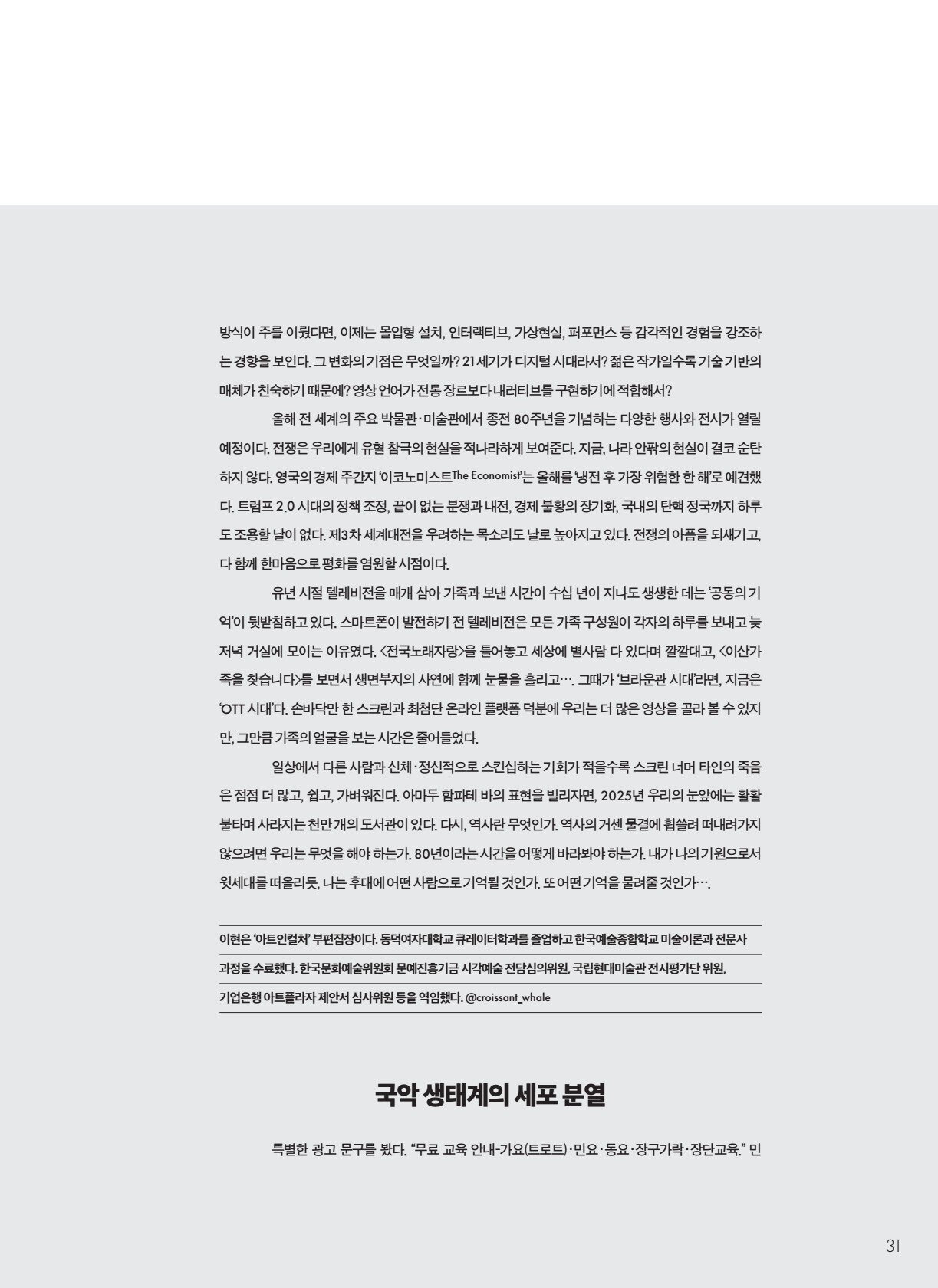
33페이지 내용 :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몰입형 설치, 인터랙티브, 가상현실, 퍼포먼스 등 감각적인 경험을 강조하 는 경향을 보인다. 그 변화의 기점은 무엇일까? 21세기가 디지털 시대라서? 젊은 작가일수록 기술 기반의 매체가 친숙하기 때문에? 영상 언어가 전통 장르보다 내러티브를 구현하기에 적합해서? 올해 전 세계의 주요 박물관·미술관에서 종전 8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전쟁은 우리에게 유혈 참극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금, 나라 안팎의 현실이 결코 순탄 하지 않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올해를 ‘냉전 후 가장 위험한 한 해’로 예견했 다. 트럼프 2.0 시대의 정책 조정, 끝이 없는 분쟁과 내전, 경제 불황의 장기화, 국내의 탄핵 정국까지 하루 도 조용할 날이 없다. 제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다 함께 한마음으로 평화를 염원할 시점이다. 유년 시절 텔레비전을 매개 삼아 가족과 보낸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한 데는 ‘공동의 기 억’이 뒷받침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발전하기 전 텔레비전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하루를 보내고 늦 저녁 거실에 모이는 이유였다. 전국노래자랑 을 틀어놓고 세상에 별사람 다 있다며 깔깔대고, 이산가 족을 찾습니다 를 보면서 생면부지의 사연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때가 ‘브라운관 시대’라면, 지금은 ‘OTT 시대’다. 손바닥만 한 스크린과 최첨단 온라인 플랫폼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영상을 골라 볼 수 있지 만, 그만큼 가족의 얼굴을 보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 신체·정신적으로 스킨십하는 기회가 적을수록 스크린 너머 타인의 죽음 은 점점 더 많고, 쉽고, 가벼워진다. 아마두 함파테 바의 표현을 빌리자면, 2025년 우리의 눈앞에는 활활 불타며 사라지는 천만 개의 도서관이 있다.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8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내가 나의 기원으로서 윗세대를 떠올리듯, 나는 후대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또 어떤 기억을 물려줄 것인가…. 이현은 ‘아트인컬처’ 부편집장이다. 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전문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 전담심의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평가단 위원, 기업은행 아트플라자 제안서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croissant_whale 국악 생태계의 세포 분열 특별한 광고 문구를 봤다. “무료 교육 안내–가요 트로트 ·민요·동요·장구가락·장단교육.” 민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