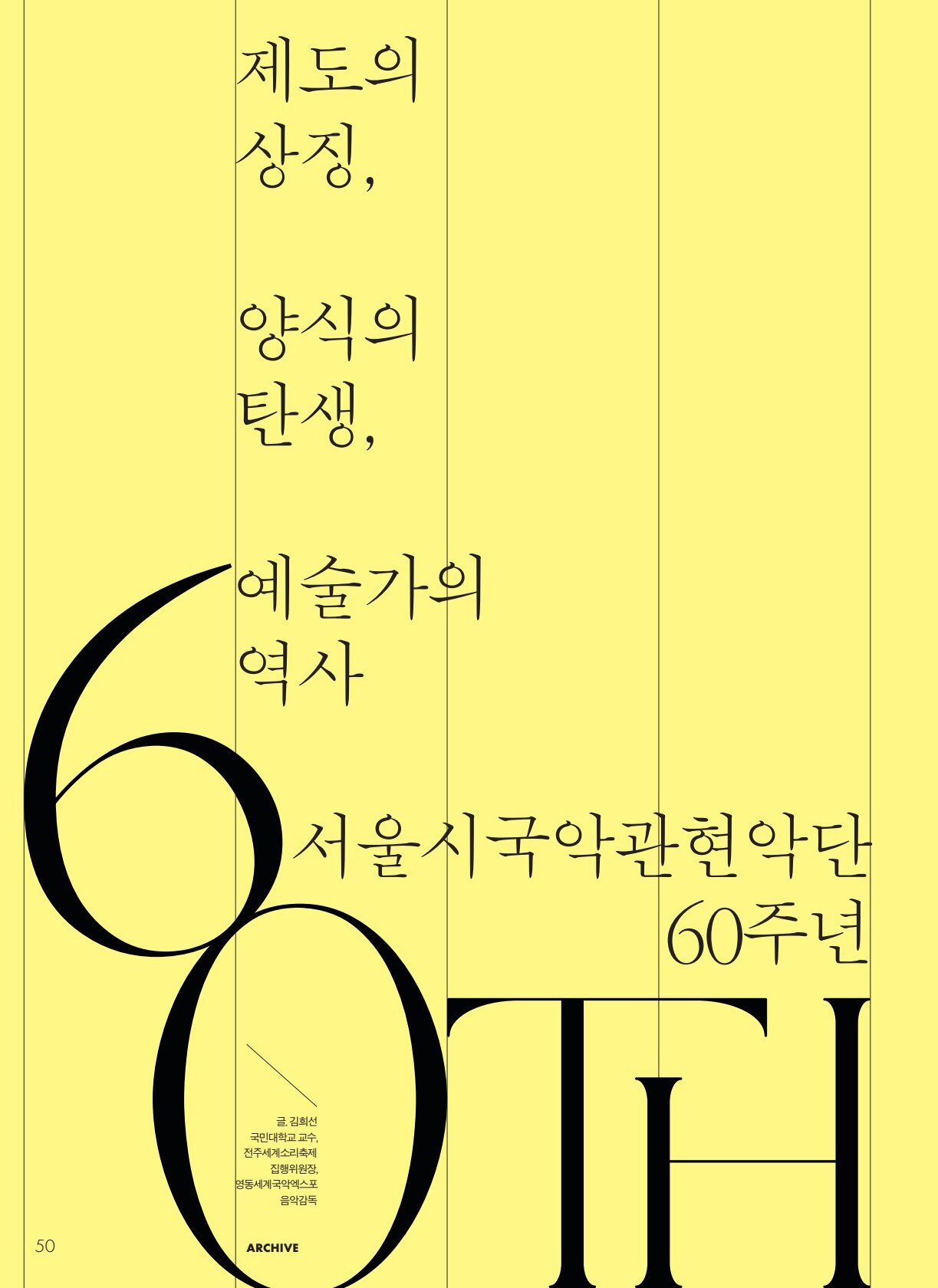
52페이지 내용 : 제도의 상징, 양식의 탄생, 예술가의 역사 서울시국악관현악단 60주년 글. 김희선 국민대학교 교수, 전주세계소리축제 집행위원장,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음악감독 50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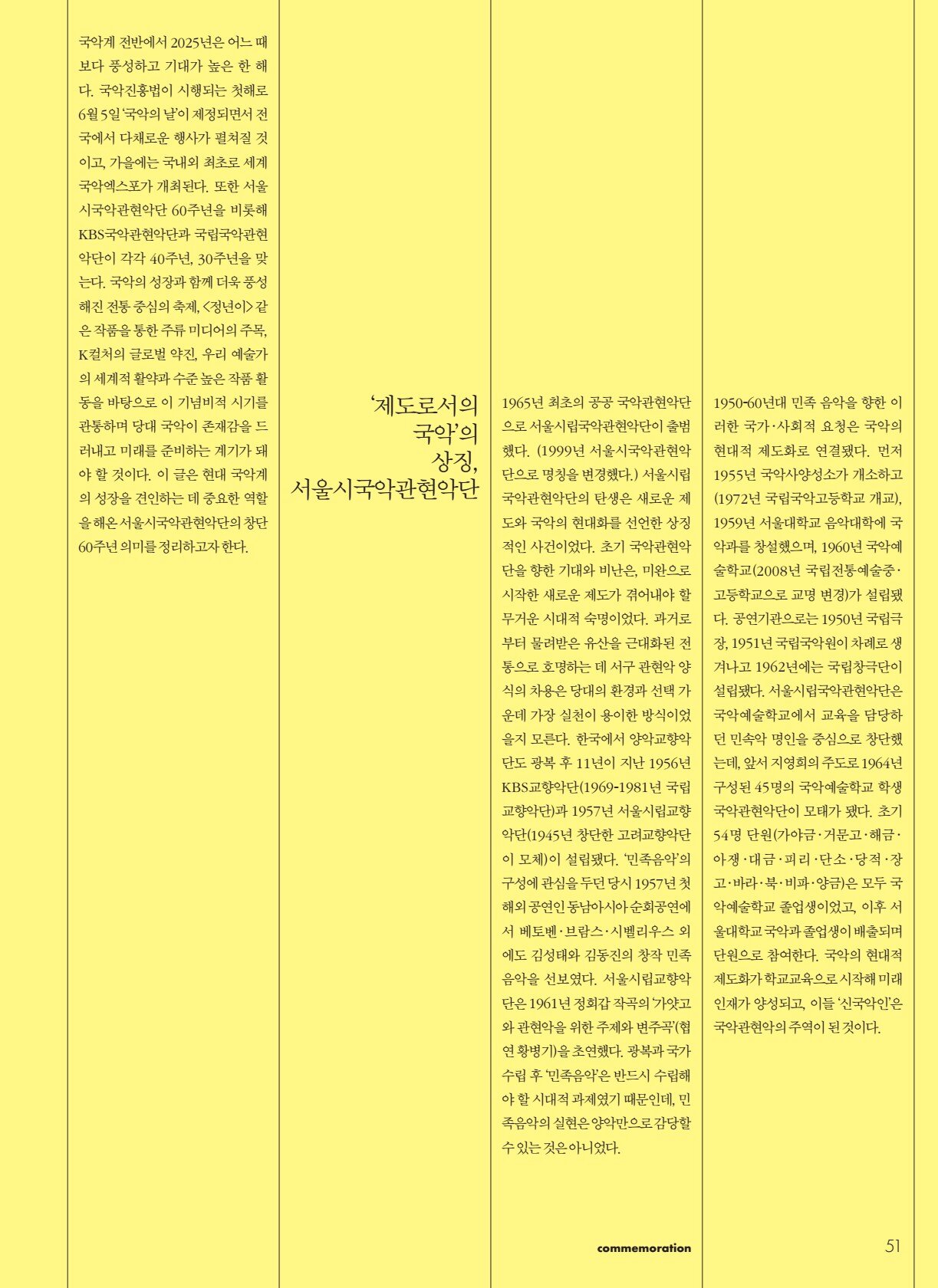
53페이지 내용 : 국악계 전반에서 2025년은 어느 때 보다 풍성하고 기대가 높은 한 해 다. 국악진흥법이 시행되는 첫해로 6월5일 ‘국악의 날’이 제정되면서 전 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것 이고, 가을에는 국내외 최초로 세계 국악엑스포가 개최된다. 또한 서울 시국악관현악단 60주년을 비롯해 KBS국악관현악단과 국립국악관현 악단이 각각 40주년, 30주년을 맞 는다. 국악의 성장과 함께 더욱 풍성 해진 전통 중심의 축제, 정년이 같 은 작품을 통한 주류 미디어의 주목, K컬처의 글로벌 약진, 우리 예술가 의 세계적 활약과 수준 높은 작품 활 동을 바탕으로 이 기념비적 시기를 관통하며 당대 국악이 존재감을 드 러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돼 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현대 국악계 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해온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창단 60주년 의미를 정리하고자 한다. 1950-60년대 민족 음악을 향한 이 러한 국가·사회적 요청은 국악의 현대적 제도화로 연결됐다. 먼저 1955년 국악사양성소가 개소하고 1972년 국립국악고등학교 개교 , 195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국 악과를 창설했으며, 1960년 국악예 술학교 2008년 국립전통예술중· 고등학교으로 교명 변경 가 설립됐 다. 공연기관으로는 1950년 국립극 장, 1951년 국립국악원이 차례로 생 겨나고 1962년에는 국립창극단이 설립됐다.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은 국악예술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 던 민속악 명인을 중심으로 창단했 는데, 앞서 지영희의 주도로 1964년 구성된 45명의 국악예술학교 학생 국악관현악단이 모태가 됐다. 초기 54명 단원 가야금·거문고·해금· 아쟁 ·대금 ·피리 ·단소 ·당적 ·장 고·바라·북·비파·양금 은 모두 국 악예술학교 졸업생이었고, 이후 서 울대학교 국악과 졸업생이 배출되며 단원으로 참여한다. 국악의 현대적 제도화가 학교교육으로 시작해 미래 인재가 양성되고, 이들 ‘신국악인’은 국악관현악의 주역이 된 것이다. 1965년 최초의 공공 국악관현악단 으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출범 했다. 1999년 서울시국악관현악 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의 탄생은 새로운 제 도와 국악의 현대화를 선언한 상징 적인 사건이었다. 초기 국악관현악 단을 향한 기대와 비난은, 미완으로 시작한 새로운 제도가 겪어내야 할 무거운 시대적 숙명이었다. 과거로 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근대화된 전 통으로 호명하는 데 서구 관현악 양 식의 차용은 당대의 환경과 선택 가 운데 가장 실천이 용이한 방식이었 을지 모른다. 한국에서 양악교향악 단도 광복 후 11년이 지난 1956년 KBS교향악단 1969-1981년 국립 교향악단 과 1957년 서울시립교향 악단 1945년 창단한 고려교향악단 이 모체 이 설립됐다. ‘민족음악’의 구성에 관심을 두던 당시 1957년 첫 해외 공연인 동남아시아 순회공연에 서 베토벤·브람스·시벨리우스 외 에도 김성태와 김동진의 창작 민족 음악을 선보였다. 서울시립교향악 단은 1961년 정회갑 작곡의 ‘가얏고 와 관현악을 위한 주제와 변주곡’ 협 연 황병기 을 초연했다. 광복과 국가 수립 후 ‘민족음악’은 반드시 수립해 야 할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인데, 민 족음악의 실현은 양악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제도로서의 국악’의 상징, 서울시국악관현악단 commemoration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