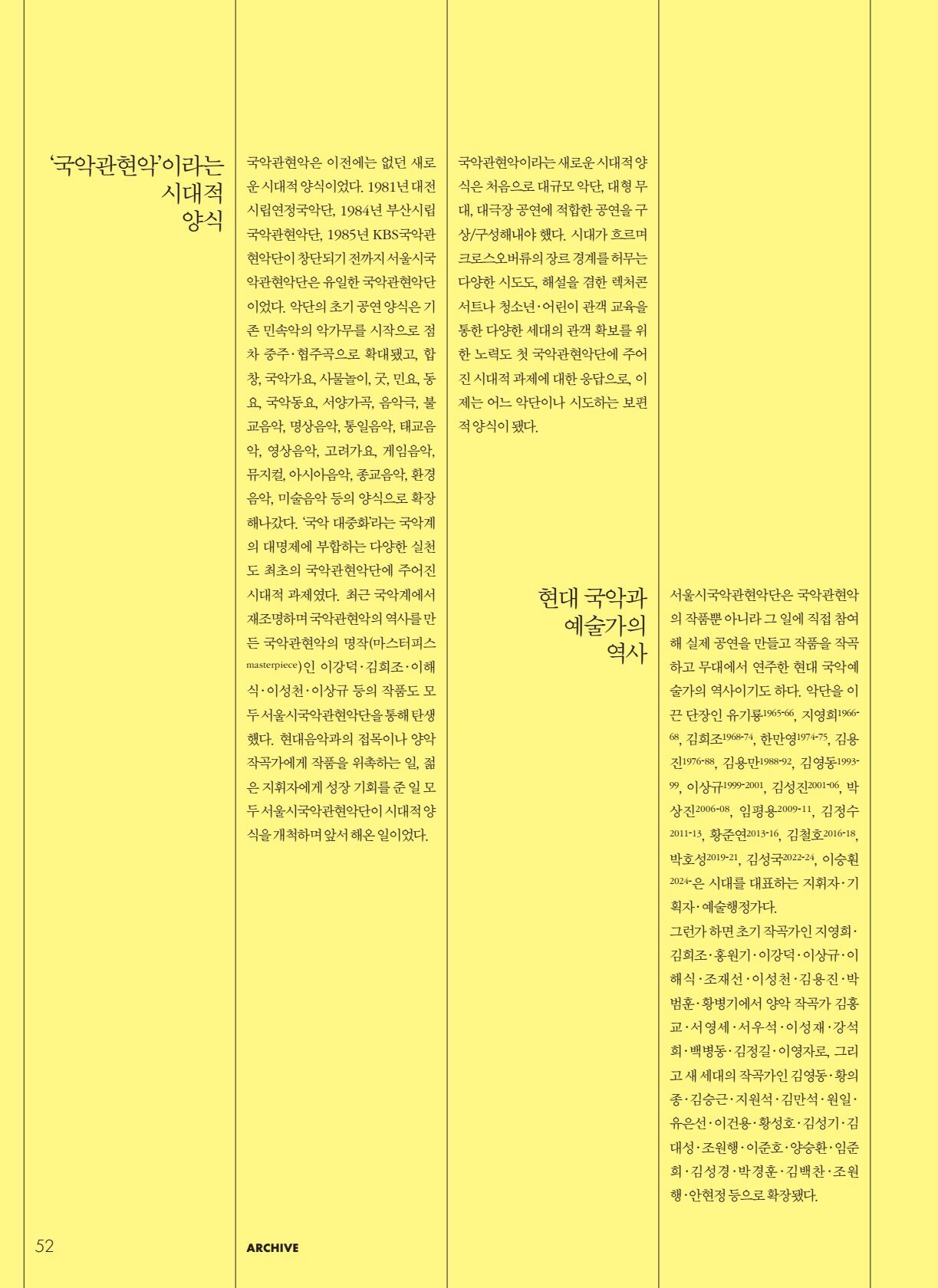
54페이지 내용 : 국악관현악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 운 시대적 양식이었다.1981년 대전 시립연정국악단, 1984년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1985년 KBS국악관 현악단이 창단되기 전까지 서울시국 악관현악단은 유일한 국악관현악단 이었다. 악단의 초기 공연 양식은 기 존 민속악의 악가무를 시작으로 점 차 중주·협주곡으로 확대됐고, 합 창, 국악가요, 사물놀이, 굿, 민요, 동 요, 국악동요, 서양가곡, 음악극, 불 교음악, 명상음악, 통일음악, 태교음 악, 영상음악, 고려가요, 게임음악, 뮤지컬, 아시아음악, 종교음악, 환경 음악, 미술음악 등의 양식으로 확장 해나갔다. ‘국악 대중화’라는 국악계 의 대명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실천 도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였다. 최근 국악계에서 재조명하며 국악관현악의 역사를 만 든 국악관현악의 명작 마스터피스 masterpiece 인 이강덕·김희조·이해 식·이성천·이상규 등의 작품도 모 두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을 통해 탄생 했다. 현대음악과의 접목이나 양악 작곡가에게 작품을 위촉하는 일, 젊 은 지휘자에게 성장 기회를 준 일 모 두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시대적 양 식을 개척하며 앞서 해온 일이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 의 작품뿐 아니라 그 일에 직접 참여 해 실제 공연을 만들고 작품을 작곡 하고 무대에서 연주한 현대 국악예 술가의 역사이기도 하다. 악단을 이 끈 단장인 유기룡1965-66, 지영희1966- 68, 김희조1968-74, 한만영1974-75, 김용 진1976-88, 김용만1988-92, 김영동1993- 99, 이상규1999-2001, 김성진2001-06, 박 상진2006-08, 임평용2009-11, 김정수 2011-13, 황준연2013-16, 김철호2016-18, 박호성2019-21, 김성국2022-24, 이승훤 2024-은 시대를 대표하는 지휘자·기 획자·예술행정가다. 그런가 하면 초기 작곡가인 지영희· 김희조·홍원기·이강덕·이상규·이 해식 ·조재선 ·이성천 ·김용진 ·박 범훈·황병기에서 양악 작곡가 김흥 교 ·서영세 ·서우석 ·이성재 ·강석 희·백병동·김정길·이영자로, 그리 고 새 세대의 작곡가인 김영동·황의 종·김승근·지원석·김만석·원일· 유은선·이건용·황성호·김성기·김 대성·조원행·이준호·양승환·임준 희 ·김성경 ·박경훈 ·김백찬 ·조원 행·안현정 등으로 확장됐다. 국악관현악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양 식은 처음으로 대규모 악단, 대형 무 대, 대극장 공연에 적합한 공연을 구 상/구성해내야 했다. 시대가 흐르며 크로스오버류의 장르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시도도, 해설을 겸한 렉처콘 서트나 청소년·어린이 관객 교육을 통한 다양한 세대의 관객 확보를 위 한 노력도 첫 국악관현악단에 주어 진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응답으로, 이 제는 어느 악단이나 시도하는 보편 적 양식이 됐다. ‘국악관현악’이라는 시대적 양식 현대 국악과 예술가의 역사 52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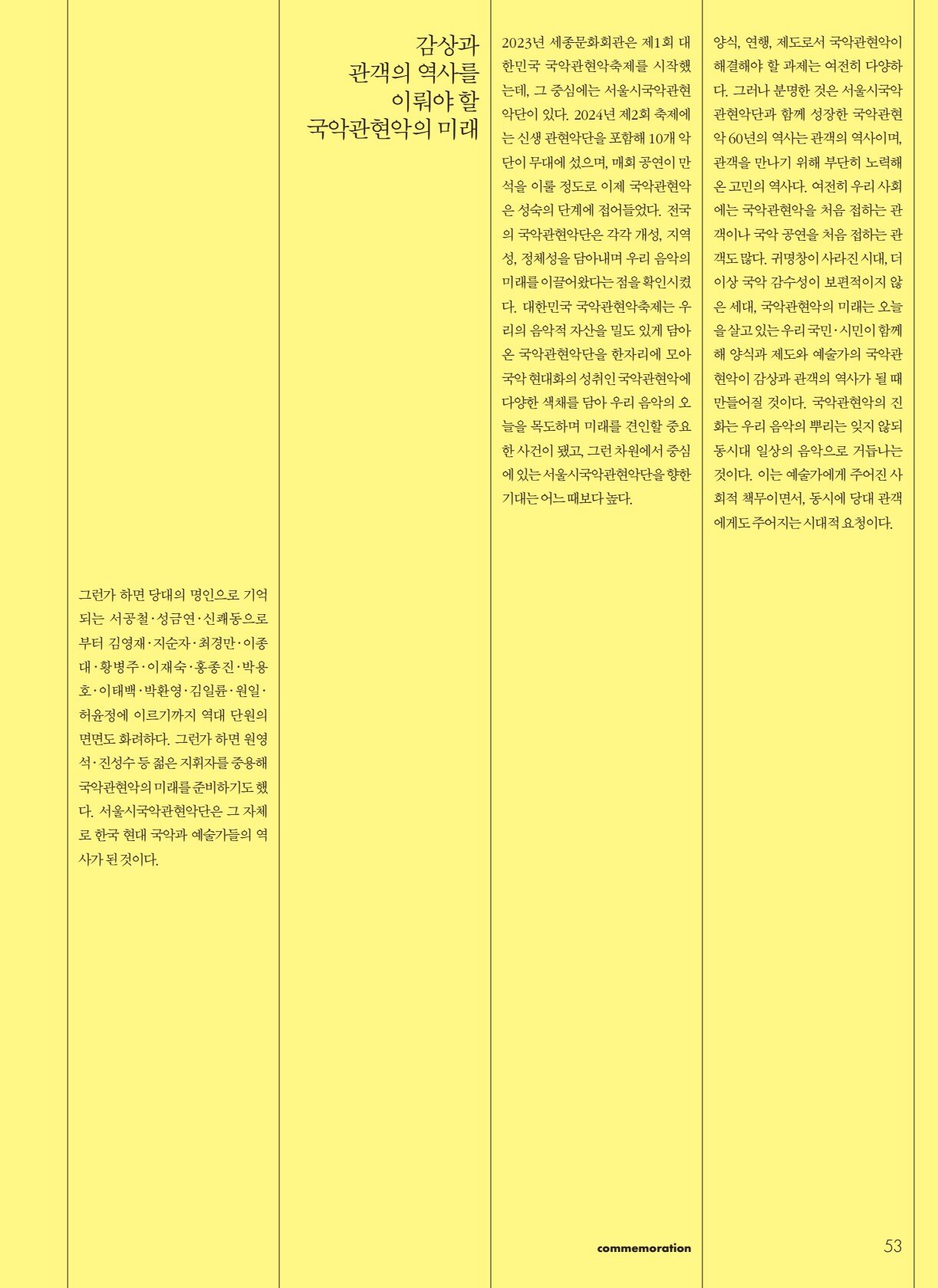
55페이지 내용 : 감상과 관객의 역사를 이뤄야 할 국악관현악의 미래 2023년 세종문화회관은 제1회 대 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를 시작했 는데, 그 중심에는 서울시국악관현 악단이 있다. 2024년 제2회 축제에 는 신생 관현악단을 포함해 10개 악 단이 무대에 섰으며, 매회 공연이 만 석을 이룰 정도로 이제 국악관현악 은 성숙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국 의 국악관현악단은 각각 개성, 지역 성, 정체성을 담아내며 우리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왔다는 점을 확인시켰 다.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는 우 리의 음악적 자산을 밀도 있게 담아 온 국악관현악단을 한자리에 모아 국악 현대화의 성취인 국악관현악에 다양한 색채를 담아 우리 음악의 오 늘을 목도하며 미래를 견인할 중요 한 사건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중심 에 있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을 향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양식, 연행, 제도로서 국악관현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다양하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울시국악 관현악단과 함께 성장한 국악관현 악 60년의 역사는 관객의 역사이며, 관객을 만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고민의 역사다. 여전히 우리 사회 에는 국악관현악을 처음 접하는 관 객이나 국악 공연을 처음 접하는 관 객도 많다. 귀명창이 사라진 시대, 더 이상 국악 감수성이 보편적이지 않 은 세대, 국악관현악의 미래는 오늘 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시민이 함께 해 양식과 제도와 예술가의 국악관 현악이 감상과 관객의 역사가 될 때 만들어질 것이다. 국악관현악의 진 화는 우리 음악의 뿌리는 잊지 않되 동시대 일상의 음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는 예술가에게 주어진 사 회적 책무이면서, 동시에 당대 관객 에게도 주어지는 시대적 요청이다. 그런가 하면 당대의 명인으로 기억 되는 서공철·성금연·신쾌동으로 부터 김영재·지순자·최경만·이종 대 ·황병주 ·이재숙 ·홍종진 ·박용 호·이태백·박환영·김일륜·원일· 허윤정에 이르기까지 역대 단원의 면면도 화려하다. 그런가 하면 원영 석·진성수 등 젊은 지휘자를 중용해 국악관현악의 미래를 준비하기도 했 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그 자체 로 한국 현대 국악과 예술가들의 역 사가 된 것이다. commemoration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