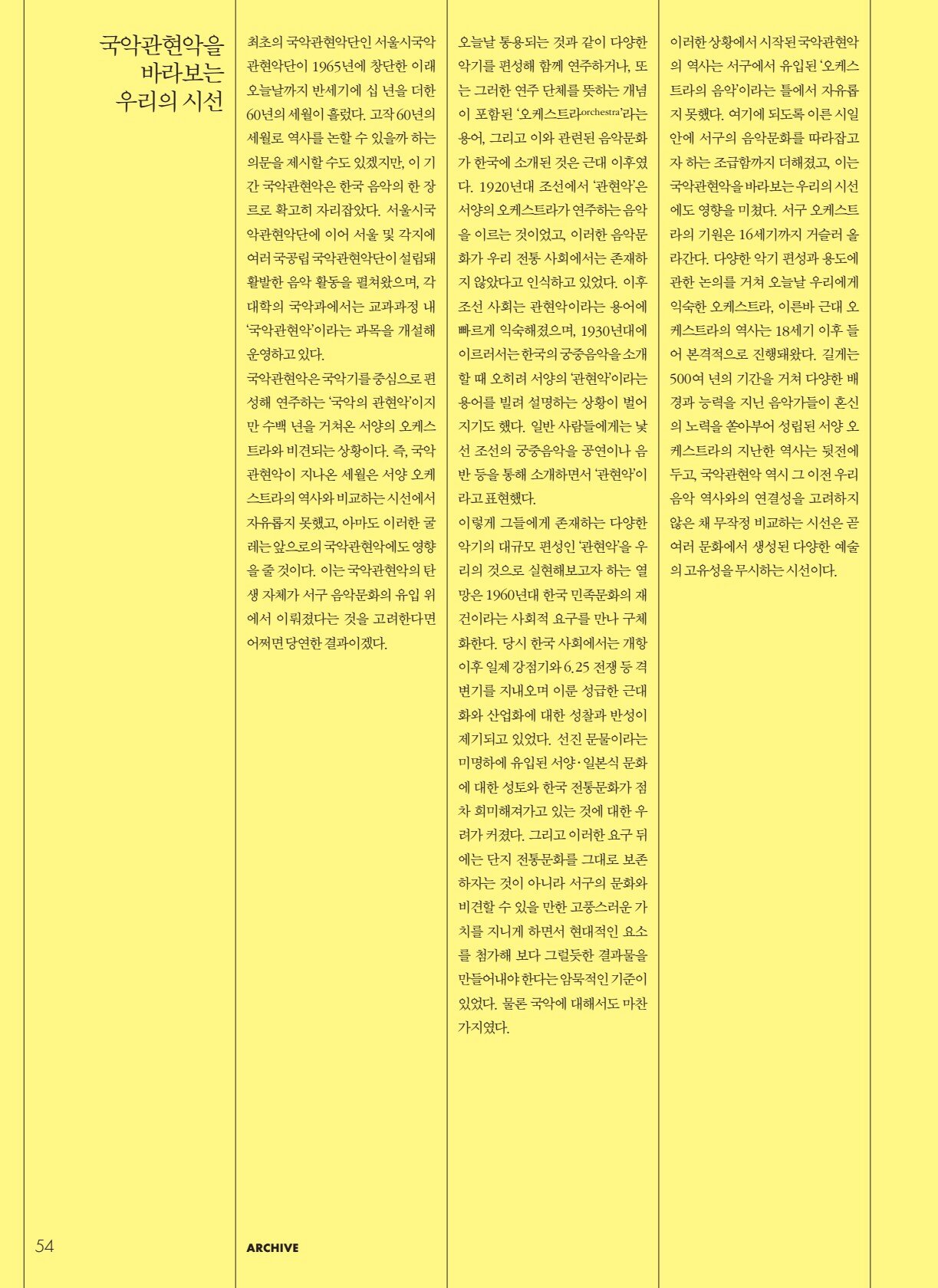
56페이지 내용 : 국악관현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인 서울시국악 관현악단이 1965년에 창단한 이래 오늘날까지 반세기에 십 년을 더한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고작60년의 세월로 역사를 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 간 국악관현악은 한국 음악의 한 장 르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서울시국 악관현악단에 이어 서울 및 각지에 여러 국공립 국악관현악단이 설립돼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쳐왔으며, 각 대학의 국악과에서는 교과과정 내 ‘국악관현악’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악관현악은 국악기를 중심으로 편 성해 연주하는 ‘국악의 관현악’이지 만 수백 년을 거쳐온 서양의 오케스 트라와 비견되는 상황이다. 즉, 국악 관현악이 지나온 세월은 서양 오케 스트라의 역사와 비교하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아마도 이러한 굴 레는 앞으로의 국악관현악에도 영향 을 줄 것이다. 이는 국악관현악의 탄 생 자체가 서구 음악문화의 유입 위 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국악관현악 의 역사는 서구에서 유입된 ‘오케스 트라의 음악’이라는 틀에서 자유롭 지 못했다. 여기에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서구의 음악문화를 따라잡고 자 하는 조급함까지 더해졌고, 이는 국악관현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구 오케스트 라의 기원은 16세기까지 거슬러 올 라간다. 다양한 악기 편성과 용도에 관한 논의를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오케스트라, 이른바 근대 오 케스트라의 역사는 18세기 이후 들 어 본격적으로 진행돼왔다. 길게는 500여 년의 기간을 거쳐 다양한 배 경과 능력을 지닌 음악가들이 혼신 의 노력을 쏟아부어 성립된 서양 오 케스트라의 지난한 역사는 뒷전에 두고, 국악관현악 역시 그 이전 우리 음악 역사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비교하는 시선은 곧 여러 문화에서 생성된 다양한 예술 의 고유성을 무시하는 시선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악기를 편성해 함께 연주하거나, 또 는 그러한 연주 단체를 뜻하는 개념 이 포함된 ‘오케스트라orchestra’라는 용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음악문화 가 한국에 소개된 것은 근대 이후였 다. 1920년대 조선에서 ‘관현악’은 서양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 을 이르는 것이었고, 이러한 음악문 화가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존재하 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조선 사회는 관현악이라는 용어에 빠르게 익숙해졌으며,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의 궁중음악을 소개 할 때 오히려 서양의 ‘관현악’이라는 용어를 빌려 설명하는 상황이 벌어 지기도 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낯 선 조선의 궁중음악을 공연이나 음 반 등을 통해 소개하면서 ‘관현악’이 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그들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악기의 대규모 편성인 ‘관현악’을 우 리의 것으로 실현해보고자 하는 열 망은 1960년대 한국 민족문화의 재 건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만나 구체 화한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개항 이후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등 격 변기를 지내오며 이룬 성급한 근대 화와 산업화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선진 문물이라는 미명하에 유입된 서양·일본식 문화 에 대한 성토와 한국 전통문화가 점 차 희미해져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 려가 커졌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 뒤 에는 단지 전통문화를 그대로 보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문화와 비견할 수 있을 만한 고풍스러운 가 치를 지니게 하면서 현대적인 요소 를 첨가해 보다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준이 있었다. 물론 국악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였다. 54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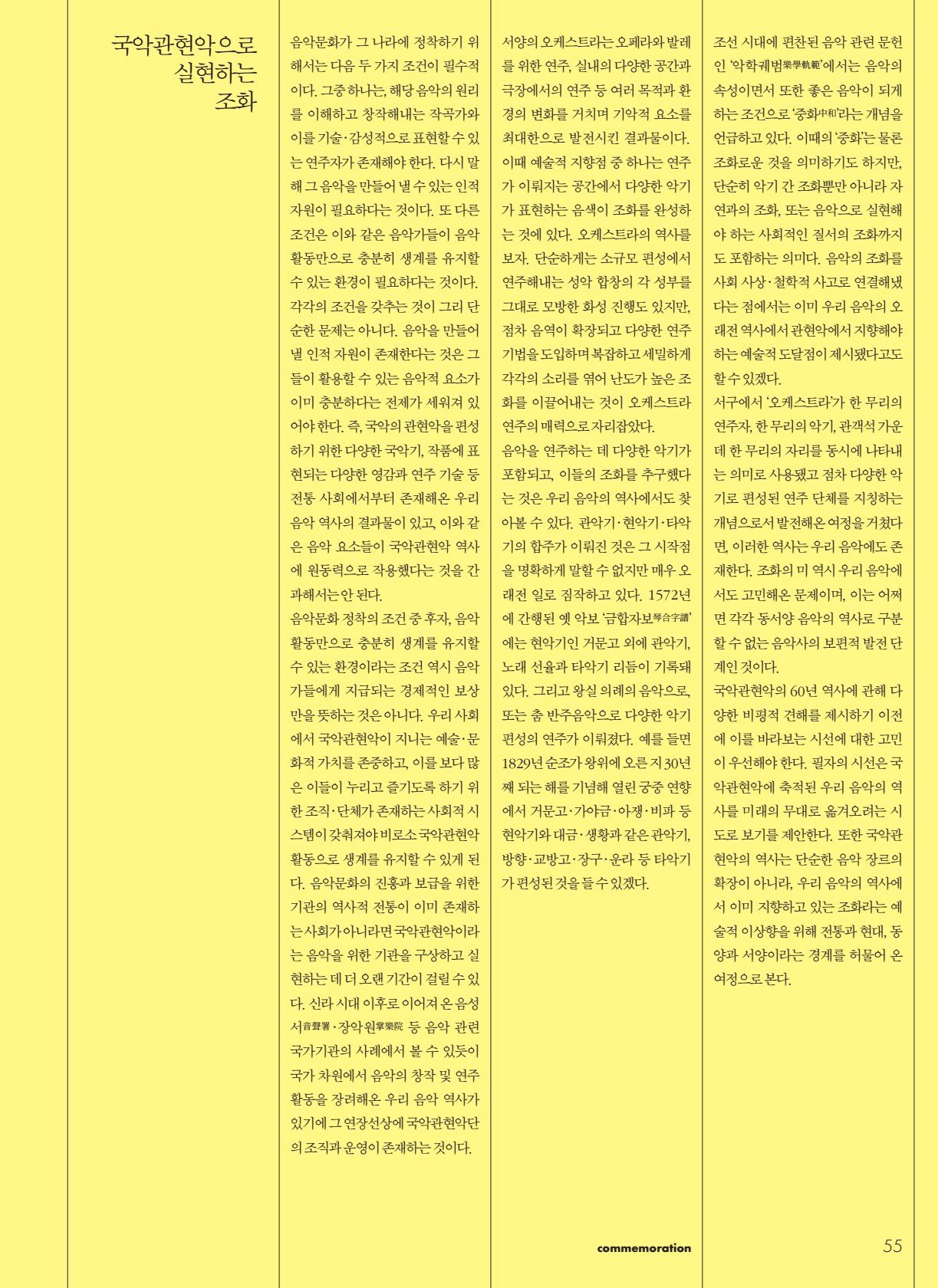
57페이지 내용 : 서양의 오케스트라는 오페라와 발레 를 위한 연주, 실내의 다양한 공간과 극장에서의 연주 등 여러 목적과 환 경의 변화를 거치며 기악적 요소를 최대한으로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이때 예술적 지향점 중 하나는 연주 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다양한 악기 가 표현하는 음색이 조화를 완성하 는 것에 있다. 오케스트라의 역사를 보자. 단순하게는 소규모 편성에서 연주해내는 성악 합창의 각 성부를 그대로 모방한 화성 진행도 있지만, 점차 음역이 확장되고 다양한 연주 기법을 도입하며 복잡하고 세밀하게 각각의 소리를 엮어 난도가 높은 조 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오케스트라 연주의 매력으로 자리잡았다. 음악을 연주하는 데 다양한 악기가 포함되고, 이들의 조화를 추구했다 는 것은 우리 음악의 역사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관악기·현악기·타악 기의 합주가 이뤄진 것은 그 시작점 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매우 오 래전 일로 짐작하고 있다. 1572년 에 간행된 옛 악보 ‘금합자보琴合字譜’ 에는 현악기인 거문고 외에 관악기, 노래 선율과 타악기 리듬이 기록돼 있다. 그리고 왕실 의례의 음악으로, 또는 춤 반주음악으로 다양한 악기 편성의 연주가 이뤄졌다. 예를 들면 1829년 순조가 왕위에 오른 지30년 째 되는 해를 기념해 열린 궁중 연향 에서 거문고·가야금·아쟁·비파 등 현악기와 대금·생황과 같은 관악기, 방향·교방고·장구·운라 등 타악기 가 편성된 것을 들 수 있겠다. 조선 시대에 편찬된 음악 관련 문헌 인 ‘악학궤범樂學軌範’에서는 음악의 속성이면서 또한 좋은 음악이 되게 하는 조건으로 ‘중화中和’라는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이때의 ‘중화’는 물론 조화로운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악기 간 조화뿐만 아니라 자 연과의 조화, 또는 음악으로 실현해 야 하는 사회적인 질서의 조화까지 도 포함하는 의미다. 음악의 조화를 사회 사상·철학적 사고로 연결해냈 다는 점에서는 이미 우리 음악의 오 래전 역사에서 관현악에서 지향해야 하는 예술적 도달점이 제시됐다고도 할 수 있겠다. 서구에서 ‘오케스트라’가 한 무리의 연주자, 한 무리의 악기, 관객석 가운 데 한 무리의 자리를 동시에 나타내 는 의미로 사용됐고 점차 다양한 악 기로 편성된 연주 단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발전해온 여정을 거쳤다 면, 이러한 역사는 우리 음악에도 존 재한다. 조화의 미 역시 우리 음악에 서도 고민해온 문제이며, 이는 어쩌 면 각각 동서양 음악의 역사로 구분 할 수 없는 음악사의 보편적 발전 단 계인 것이다. 국악관현악의 60년 역사에 관해 다 양한 비평적 견해를 제시하기 이전 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고민 이 우선해야 한다. 필자의 시선은 국 악관현악에 축적된 우리 음악의 역 사를 미래의 무대로 옮겨오려는 시 도로 보기를 제안한다. 또한 국악관 현악의 역사는 단순한 음악 장르의 확장이 아니라, 우리 음악의 역사에 서 이미 지향하고 있는 조화라는 예 술적 이상향을 위해 전통과 현대, 동 양과 서양이라는 경계를 허물어 온 여정으로 본다. 음악문화가 그 나라에 정착하기 위 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 이다. 그중 하나는, 해당 음악의 원리 를 이해하고 창작해내는 작곡가와 이를 기술·감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 는 연주자가 존재해야 한다. 다시 말 해 그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조건은 이와 같은 음악가들이 음악 활동만으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각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그리 단 순한 문제는 아니다. 음악을 만들어 낼 인적 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음악적 요소가 이미 충분하다는 전제가 세워져 있 어야 한다. 즉, 국악의 관현악을 편성 하기 위한 다양한 국악기, 작품에 표 현되는 다양한 영감과 연주 기술 등 전통 사회에서부터 존재해온 우리 음악 역사의 결과물이 있고, 이와 같 은 음악 요소들이 국악관현악 역사 에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음악문화 정착의 조건 중 후자, 음악 활동만으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조건 역시 음악 가들에게 지급되는 경제적인 보상 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 에서 국악관현악이 지니는 예술·문 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보다 많 은 이들이 누리고 즐기도록 하기 위 한 조직·단체가 존재하는 사회적 시 스템이 갖춰져야 비로소 국악관현악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다. 음악문화의 진흥과 보급을 위한 기관의 역사적 전통이 이미 존재하 는 사회가 아니라면 국악관현악이라 는 음악을 위한 기관을 구상하고 실 현하는 데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 다. 신라 시대 이후로 이어져 온 음성 서音聲署 ·장악원掌樂院 등 음악 관련 국가기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차원에서 음악의 창작 및 연주 활동을 장려해온 우리 음악 역사가 있기에 그 연장선상에 국악관현악단 의 조직과 운영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악관현악으로 실현하는 조화 commemoration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