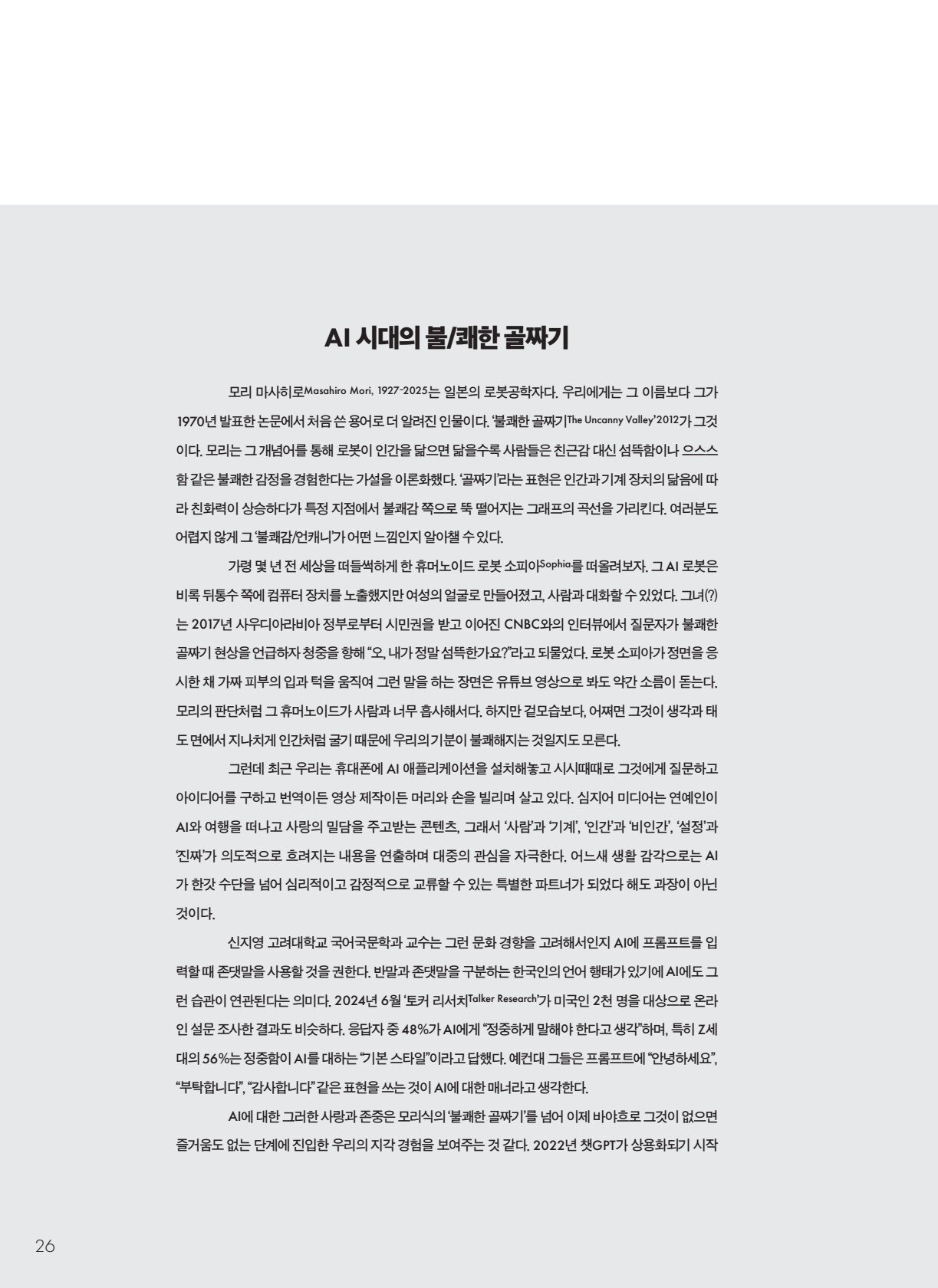
28페이지 내용 : AI 시대의 불/쾌한 골짜기 모리 마사히로Masahiro Mori, 1927-2025는 일본의 로봇공학자다. 우리에게는 그 이름보다 그가 1970년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쓴 용어로 더 알려진 인물이다. ‘불쾌한 골짜기The Uncanny Valley’2012가 그것 이다. 모리는 그 개념어를 통해 로봇이 인간을 닮으면 닮을수록 사람들은 친근감 대신 섬뜩함이나 으스스 함 같은 불쾌한 감정을 경험한다는 가설을 이론화했다. ‘골짜기’라는 표현은 인간과 기계 장치의 닮음에 따 라 친화력이 상승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불쾌감 쪽으로 뚝 떨어지는 그래프의 곡선을 가리킨다.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그 ‘불쾌감/언캐니’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챌 수 있다. 가령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Sophia를 떠올려보자. 그 AI 로봇은 비록 뒤통수 쪽에 컴퓨터 장치를 노출했지만 여성의 얼굴로 만들어졌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었다. 그녀 ? 는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시민권을 받고 이어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자가 불쾌한 골짜기 현상을 언급하자 청중을 향해 “오, 내가 정말 섬뜩한가요?”라고 되물었다. 로봇 소피아가 정면을 응 시한 채 가짜 피부의 입과 턱을 움직여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은 유튜브 영상으로 봐도 약간 소름이 돋는다. 모리의 판단처럼 그 휴머노이드가 사람과 너무 흡사해서다. 하지만 겉모습보다, 어쩌면 그것이 생각과 태 도 면에서 지나치게 인간처럼 굴기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불쾌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휴대폰에 AI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놓고 시시때때로 그것에게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구하고 번역이든 영상 제작이든 머리와 손을 빌리며 살고 있다. 심지어 미디어는 연예인이 AI와 여행을 떠나고 사랑의 밀담을 주고받는 콘텐츠, 그래서 ‘사람’과 ‘기계’, ‘인간’과 ‘비인간’, ‘설정’과 ‘진짜’가 의도적으로 흐려지는 내용을 연출하며 대중의 관심을 자극한다. 어느새 생활 감각으로는 AI 가 한갓 수단을 넘어 심리적이고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파트너가 되었다 해도 과장이 아닌 것이다. 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그런 문화 경향을 고려해서인지 AI에 프롬프트를 입 력할 때 존댓말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반말과 존댓말을 구분하는 한국인의 언어 행태가 있기에 AI에도 그 런 습관이 연관된다는 의미다. 2024년 6월 ‘토커 리서치Talker Research’가 미국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 조사한 결과도 비슷하다. 응답자 중 48%가 AI에게 “정중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Z세 대의 56%는 정중함이 AI를 대하는 “기본 스타일”이라고 답했다. 예컨대 그들은 프롬프트에 “안녕하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AI에 대한 매너라고 생각한다. AI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존중은 모리식의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 이제 바야흐로 그것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는 단계에 진입한 우리의 지각 경험을 보여주는 것 같다. 2022년 챗GPT가 상용화되기 시작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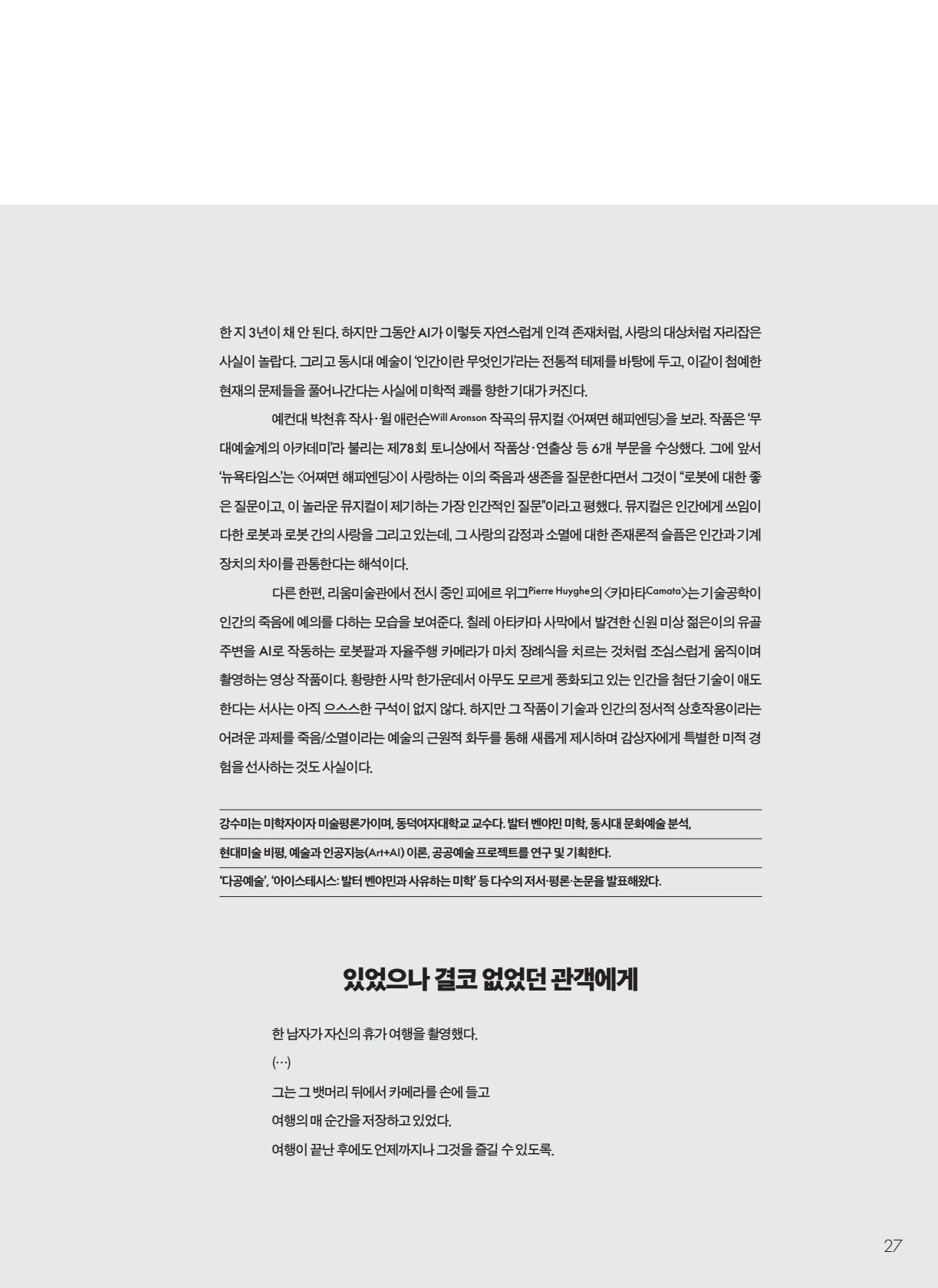
29페이지 내용 : 한 지 3년이 채 안 된다. 하지만 그동안 AI가 이렇듯 자연스럽게 인격 존재처럼, 사랑의 대상처럼 자리잡은 사실이 놀랍다. 그리고 동시대 예술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전통적 테제를 바탕에 두고, 이같이 첨예한 현재의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는 사실에 미학적 쾌를 향한 기대가 커진다. 예컨대 박천휴 작사·윌 애런슨Will Aronson 작곡의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을 보라. 작품은 ‘무 대예술계의 아카데미’라 불리는 제78회 토니상에서 작품상·연출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했다. 그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어쩌면 해피엔딩 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생존을 질문한다면서 그것이 “로봇에 대한 좋 은 질문이고, 이 놀라운 뮤지컬이 제기하는 가장 인간적인 질문”이라고 평했다. 뮤지컬은 인간에게 쓰임이 다한 로봇과 로봇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그 사랑의 감정과 소멸에 대한 존재론적 슬픔은 인간과 기계 장치의 차이를 관통한다는 해석이다. 다른 한편, 리움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의 카마타Camata 는 기술공학이 인간의 죽음에 예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발견한 신원 미상 젊은이의 유골 주변을 AI로 작동하는 로봇팔과 자율주행 카메라가 마치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촬영하는 영상 작품이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풍화되고 있는 인간을 첨단 기술이 애도 한다는 서사는 아직 으스스한 구석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 작품이 기술과 인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죽음/소멸이라는 예술의 근원적 화두를 통해 새롭게 제시하며 감상자에게 특별한 미적 경 험을 선사하는 것도 사실이다. 강수미는 미학자이자 미술평론가이며,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다. 발터 벤야민 미학, 동시대 문화예술 분석, 현대미술 비평, 예술과 인공지능 Art+AI 이론,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연구 및 기획한다. ‘다공예술’, ‘아이스테시스발터 벤야민과 사유하는 미학’ 등 다수의 저서·평론·논문을 발표해왔다. 있었으나 결코 없었던 관객에게 한 남자가 자신의 휴가 여행을 촬영했다. … 그는 그 뱃머리 뒤에서 카메라를 손에 들고 여행의 매 순간을 저장하고 있었다. 여행이 끝난 후에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