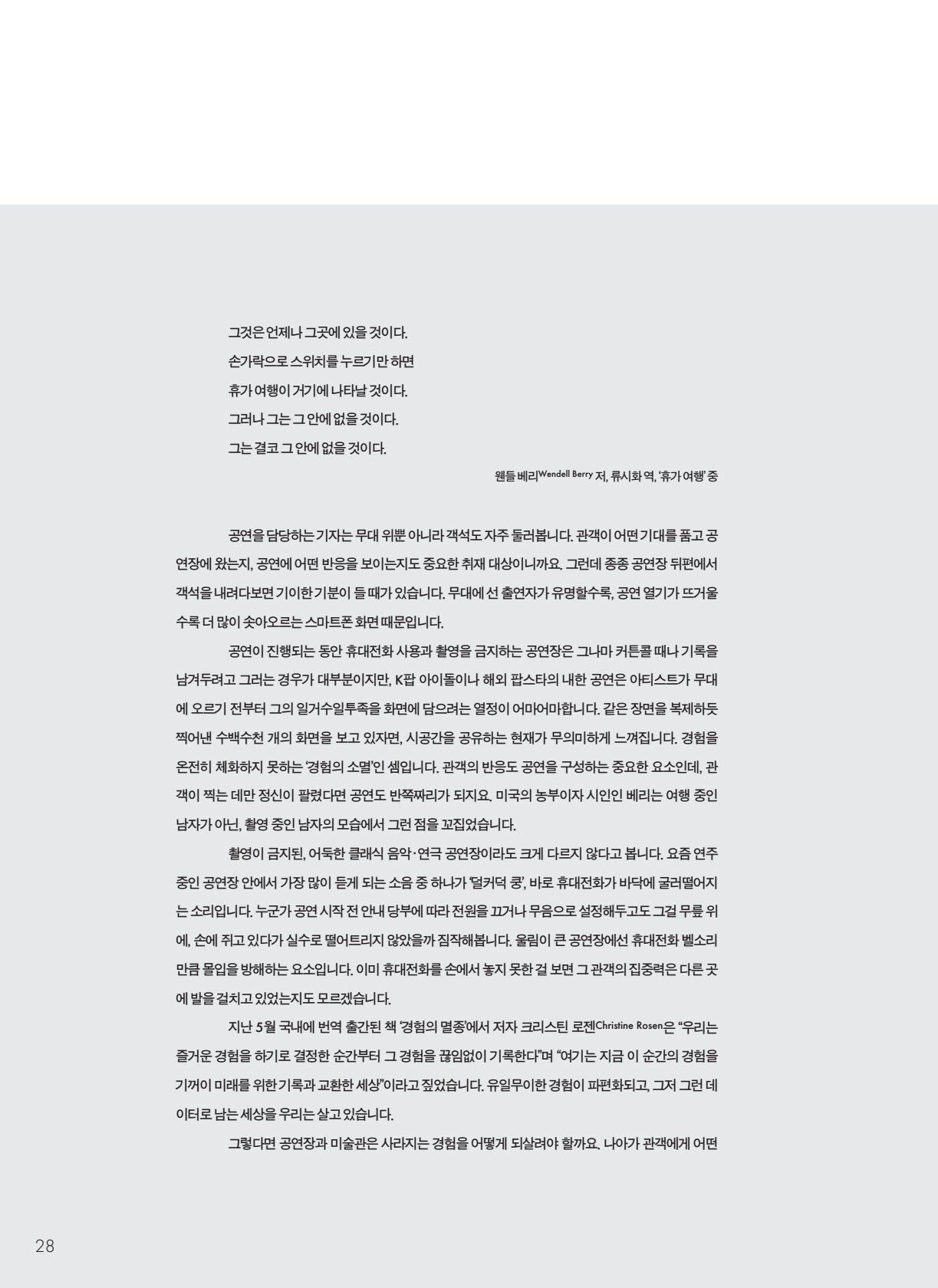
30페이지 내용 :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이다. 손가락으로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휴가 여행이 거기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 없을 것이다. 그는 결코 그 안에 없을 것이다. 웬들 베리Wendell Berry 저, 류시화 역, ‘휴가 여행’ 중 공연을 담당하는 기자는 무대 위뿐 아니라 객석도 자주 둘러봅니다. 관객이 어떤 기대를 품고 공 연장에 왔는지, 공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중요한 취재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종종 공연장 뒤편에서 객석을 내려다보면 기이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대에 선 출연자가 유명할수록, 공연 열기가 뜨거울 수록 더 많이 솟아오르는 스마트폰 화면 때문입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휴대전화 사용과 촬영을 금지하는 공연장은 그나마 커튼콜 때나 기록을 남겨두려고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K팝 아이돌이나 해외 팝스타의 내한 공연은 아티스트가 무대 에 오르기 전부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화면에 담으려는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같은 장면을 복제하듯 찍어낸 수백수천 개의 화면을 보고 있자면, 시공간을 공유하는 현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경험을 온전히 체화하지 못하는 ‘경험의 소멸’인 셈입니다. 관객의 반응도 공연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관 객이 찍는 데만 정신이 팔렸다면 공연도 반쪽짜리가 되지요. 미국의 농부이자 시인인 베리는 여행 중인 남자가 아닌, 촬영 중인 남자의 모습에서 그런 점을 꼬집었습니다. 촬영이 금지된, 어둑한 클래식 음악·연극 공연장이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연주 중인 공연장 안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소음 중 하나가 ‘덜커덕 쿵’, 바로 휴대전화가 바닥에 굴러떨어지 는 소리입니다. 누군가 공연 시작 전 안내 당부에 따라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설정해두고도 그걸 무릎 위 에, 손에 쥐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트리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울림이 큰 공연장에선 휴대전화 벨소리 만큼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이미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한 걸 보면 그 관객의 집중력은 다른 곳 에 발을 걸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국내에 번역 출간된 책 ‘경험의 멸종’에서 저자 크리스틴 로젠Christine Rosen은 “우리는 즐거운 경험을 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 경험을 끊임없이 기록한다”며 “여기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기꺼이 미래를 위한 기록과 교환한 세상”이라고 짚었습니다. 유일무이한 경험이 파편화되고, 그저 그런 데 이터로 남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연장과 미술관은 사라지는 경험을 어떻게 되살려야 할까요. 나아가 관객에게 어떤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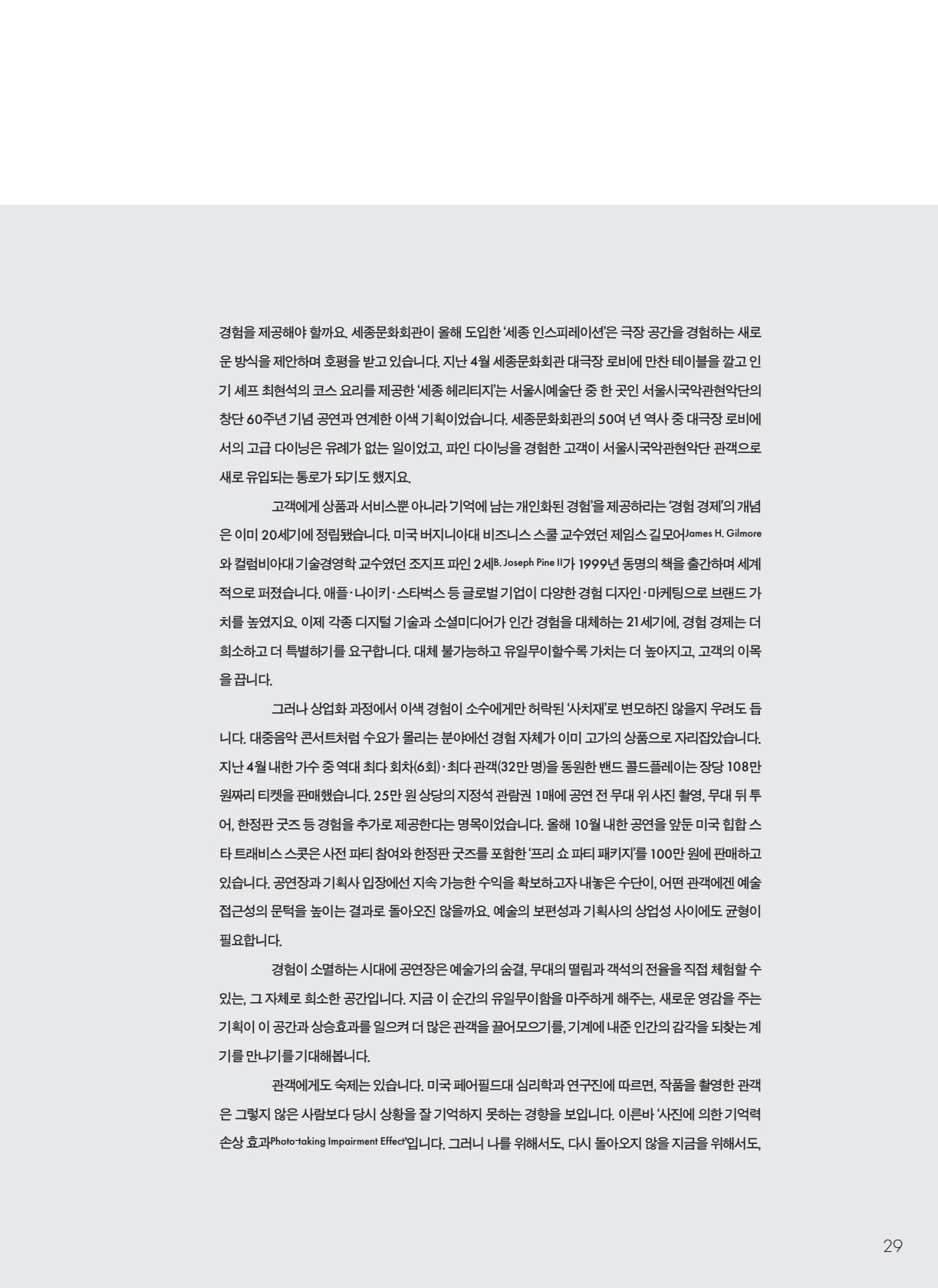
31페이지 내용 : 경험을 제공해야 할까요. 세종문화회관이 올해 도입한 ‘세종 인스피레이션’은 극장 공간을 경험하는 새로 운 방식을 제안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 만찬 테이블을 깔고 인 기 셰프 최현석의 코스 요리를 제공한 ‘세종 헤리티지’는 서울시예술단 중 한 곳인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창단 60주년 기념 공연과 연계한 이색 기획이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50여 년 역사 중 대극장 로비에 서의 고급 다이닝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파인 다이닝을 경험한 고객이 서울시국악관현악단 관객으로 새로 유입되는 통로가 되기도 했지요.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뿐 아니라 ‘기억에 남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라는 ‘경험 경제’의 개념 은 이미 20세기에 정립됐습니다. 미국 버지니아대 비즈니스 스쿨 교수였던 제임스 길모어James H. Gilmore 와 컬럼비아대 기술경영학 교수였던 조지프 파인 2세B. Joseph Pine II가 1999년 동명의 책을 출간하며 세계 적으로 퍼졌습니다. 애플·나이키·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이 다양한 경험 디자인·마케팅으로 브랜드 가 치를 높였지요. 이제 각종 디지털 기술과 소셜미디어가 인간 경험을 대체하는 21세기에, 경험 경제는 더 희소하고 더 특별하기를 요구합니다. 대체 불가능하고 유일무이할수록 가치는 더 높아지고, 고객의 이목 을 끕니다. 그러나 상업화 과정에서 이색 경험이 소수에게만 허락된 ‘사치재’로 변모하진 않을지 우려도 듭 니다. 대중음악 콘서트처럼 수요가 몰리는 분야에선 경험 자체가 이미 고가의 상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4월 내한 가수 중 역대 최다 회차 6회 ·최다 관객 32만 명 을 동원한 밴드 콜드플레이는 장당 108만 원짜리 티켓을 판매했습니다. 25만 원 상당의 지정석 관람권 1매에 공연 전 무대 위 사진 촬영, 무대 뒤 투 어, 한정판 굿즈 등 경험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올해 10월 내한 공연을 앞둔 미국 힙합 스 타 트래비스 스콧은 사전 파티 참여와 한정판 굿즈를 포함한 ‘프리 쇼 파티 패키지’를 1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연장과 기획사 입장에선 지속 가능한 수익을 확보하고자 내놓은 수단이, 어떤 관객에겐 예술 접근성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로 돌아오진 않을까요. 예술의 보편성과 기획사의 상업성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소멸하는 시대에 공연장은 예술가의 숨결, 무대의 떨림과 객석의 전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자체로 희소한 공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유일무이함을 마주하게 해주는, 새로운 영감을 주는 기획이 이 공간과 상승효과를 일으켜 더 많은 관객을 끌어모으기를, 기계에 내준 인간의 감각을 되찾는 계 기를 만나기를 기대해봅니다. 관객에게도 숙제는 있습니다. 미국 페어필드대 심리학과 연구진에 따르면, 작품을 촬영한 관객 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른바 ‘사진에 의한 기억력 손상 효과Photo-taking Impairment Effect’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지금을 위해서도,29